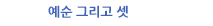풀빵 꼬랑지
작성자 조금엽
등록일 1999-11-12
조회수 1564
아파트 입구에 풀빵 장수가 자리를 잡았다.
겨울의 시작이다.
학교에서 돌아오는 큰 아이의 손에 풀빵 봉지가 들려 있다.
엄마가 좋아하는 풀빵이라고.
1000원이면 5개씩이나 주는 맘씨 좋은 고기빵,
따끈따끈하고 바삭바삭한 풀빵을 베어 물며 배시시 미소를 짓는다.
"진아, 있잖어~ 풀빵은 어디가 젤 맛있게?"
아들 녀석은 당연히 팥이 많은 머리쪽이란다.
다행이다. 아직은 풀빵의 제 맛을 모르니.^^
아들은 머리쪽, 나는 꼬랑지...
풀빵이란 바삭바삭한 꼬랑지가 역시나 맛있다던 친구 생각이 났다.
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기억되던 풍경처럼
삶의 모퉁이마다에는 저절로 새겨진 그림들이 있다.
오래전 칼에 베어 이제는 흉터조차 흐릿한데도 그 언저리를 바라볼 때마다
아팠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.
건너지 못하는 기억의 저편에 사는 것도 아닌데
오늘도 나는 많은 것을 핑계하며 무심히(?) 살고 있다.
겨울의 시작이다.
학교에서 돌아오는 큰 아이의 손에 풀빵 봉지가 들려 있다.
엄마가 좋아하는 풀빵이라고.
1000원이면 5개씩이나 주는 맘씨 좋은 고기빵,
따끈따끈하고 바삭바삭한 풀빵을 베어 물며 배시시 미소를 짓는다.
"진아, 있잖어~ 풀빵은 어디가 젤 맛있게?"
아들 녀석은 당연히 팥이 많은 머리쪽이란다.
다행이다. 아직은 풀빵의 제 맛을 모르니.^^
아들은 머리쪽, 나는 꼬랑지...
풀빵이란 바삭바삭한 꼬랑지가 역시나 맛있다던 친구 생각이 났다.
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기억되던 풍경처럼
삶의 모퉁이마다에는 저절로 새겨진 그림들이 있다.
오래전 칼에 베어 이제는 흉터조차 흐릿한데도 그 언저리를 바라볼 때마다
아팠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.
건너지 못하는 기억의 저편에 사는 것도 아닌데
오늘도 나는 많은 것을 핑계하며 무심히(?) 살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