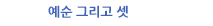한여름 밤 창가에서
작성자 조금엽
등록일 2006-08-15
조회수 933
서른 무렵을 지날 때부터 마흔 무렵까지 10여년을 아파트의 2층에서 살았습니다.
땅과 가까운 2층은 비 오는 날이면 음악 같은 빗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연록의 새순이 돋는 것에서부터 꽃이 피고 지는 풍경, 단풍이 물드는 것과 낙엽 되어 길바닥에 뒹구는 모습까지 계절과 자연의 변화를 쉬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.
그리고 요즘 같은 여름에는 밤새도록 울어대는 풀벌레 소리에 차마 잠 못 이루고 귀를 기울이는 낭만을 누리기도 했습니다.
그런데 2~3년 전 그보다 10층이 더 높은 이 곳, 바다가 보이는 집으로 이사를 오고부터는 그러한 변화들에 대해 둔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아래를 내려다보아 땅이 젖어있으면 그제야 비가 온 것을 알 수 있었고 언제 계절이 오가는지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.
물론 아래층에 비해 더 밝고 시원하며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.
어제는 자정을 넘긴 조용한 시각에 창문을 열고 바깥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.
불을 끄고 듣는 풀벌레소리,
‘어찌 그리 오래도록 나를 잊었냐?’고 묻는 듯한 그 소리가 천지에 가득했습니다.
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.
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.
그런데 새로운 것에 마음이 빼앗기느라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더 소중한 것을 잃는다면
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?
생각이 많은 밤,
한여름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.
땅과 가까운 2층은 비 오는 날이면 음악 같은 빗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연록의 새순이 돋는 것에서부터 꽃이 피고 지는 풍경, 단풍이 물드는 것과 낙엽 되어 길바닥에 뒹구는 모습까지 계절과 자연의 변화를 쉬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.
그리고 요즘 같은 여름에는 밤새도록 울어대는 풀벌레 소리에 차마 잠 못 이루고 귀를 기울이는 낭만을 누리기도 했습니다.
그런데 2~3년 전 그보다 10층이 더 높은 이 곳, 바다가 보이는 집으로 이사를 오고부터는 그러한 변화들에 대해 둔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아래를 내려다보아 땅이 젖어있으면 그제야 비가 온 것을 알 수 있었고 언제 계절이 오가는지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.
물론 아래층에 비해 더 밝고 시원하며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.
어제는 자정을 넘긴 조용한 시각에 창문을 열고 바깥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.
불을 끄고 듣는 풀벌레소리,
‘어찌 그리 오래도록 나를 잊었냐?’고 묻는 듯한 그 소리가 천지에 가득했습니다.
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.
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.
그런데 새로운 것에 마음이 빼앗기느라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더 소중한 것을 잃는다면
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?
생각이 많은 밤,
한여름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.